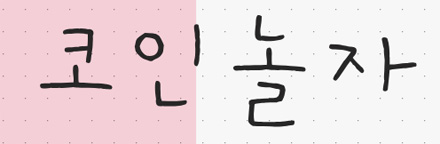금가격이 연일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g당 금가격이 20만원대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금은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며, 특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금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급등락 제한이 없다는 것과 개인이 현 시세 그대로 매매와 매입이 어렵다는 것은 상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먼저, 오늘의 금시세를 알아보자.
한국거래소의 오늘의 금시세는 g당 204,620원, 금한돈 순금시세는 767,325원이다.
한국표준금거래소 같은 경우, 순금 1돈(24K)의 오늘의 금시세는 내가 팔때 741,000원, 18K 금시세는 544,600원, 14k 금시세는 422,300원, 백금시세는 261,000원, 순은시세 8,310원, 순금 1돈 내가 살때는 869,000원이다.

가상화폐 시세는 어떻게 될까?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의 시세는 다음과 같다.
11월 13일, 오전 10시 50분, 비트코인(바이낸스) 1BTC 102,063.25 달러
리플(바이낸스) 1XRP 2.41 달러
11월 12일, 오전 11시 07분, 비트코인(바이낸스) 1BTC 103,279.28 달러 보다 1216.03 하락했으며, 리플 시세는 0.01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밈 가상화폐로 잘 알려진 오피셜 트럼프는 1TRUMP 7.61 달러를 도지코인 시세는 1DOGE 0.17111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출현한 지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여전히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큰 수익의 기회와 동시에 막대한 손실의 위험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을 앞세워 등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1:1 비율로 고정하는 암호화폐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존 금융시장의 결제 단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세 가지 모델로 나뉜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은행에 예치된 자산을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이 높지만, 중앙화된 구조로 인해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암호자산 담보형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담보 가치의 급락 시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기반은 코인의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신뢰가 붕괴되면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그 근간은 여전히 '신뢰'에 의존하고 있다. 발행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규제 당국의 감독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달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자산으로 정의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발행사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금융 질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달러로 불리며 안정성과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벽한 안전자산이라 부르기에는 이른 실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려는 시도로, 1코인 당 1달러의 가치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 안정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기초 자산의 규모와 투명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와 서클의 USDC는 준비금을 통해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준비금의 투명성 문제로 인해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달러'라는 개념이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적 안정성이 곧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의 테라 -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알고리즘 기반 모델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결국 알고리즘이 아닌 담보 자산의 현실성에 달려 있으며, 시장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1달러 페그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진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형 금융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관리 문제를 넘어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자본 이동 통제와도 직결된다.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은 안정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정신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와 자유화의 모순적 균형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그렇기때문에 안전성은 법적 제도적 신뢰와 투명한 담보 구조가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아